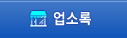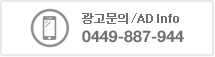명상편지 | 첫 자전거 여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seonjae 작성일2014-12-17 06:33 조회1,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첫 자전거 여행
끝을 알 수 없는 길이 계속 되고 있었다.
주위는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흔들거리는 불빛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밀려드는 3월의 추위는,
나의 몸과 마음을 점점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대학교 입학이 결정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입학 전 3일간 자전거로 달려 입학식에 참가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추억 중의 하나가 될 듯했다.
그것도 무전여행으로….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하실 아버지껜,
자전거는 기차로 실어 보내고
저도 조금 일찍 가겠다고만 말씀드렸다.
평소 애지중지하던 클래식 기타 한 대와, 전국 도로 지도,
그리고 옷가지들을 챙겨 자전거에 올랐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도로 약 500km!
온갖 부푼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하이킹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밤낮의 극심한 기온 차, 갈증과 허기,
거기에 체력의 한계까지.
내가 생각했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자전거 여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겨우 하루를 넘기고 둘째 날.
대구에서 출발해 대전까지를 목표로 세웠지만,
터무니없는 계획이었다.
옥천 경계를 넘을 때쯤, 벌써 해는 지고 주위는 온통 캄캄했다.
밤 10시가 넘어 겨우 발견한 마을 슈퍼에서,
초코바와 우유하나를 사서 먹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가다간 탈진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약국 문을 열고 사정을 얘기하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허사였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것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안으로 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연해, 부탁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나마 근처 경찰서가 있으니 가보라는 얘기에 희망을 갖고 문을 나왔다.
추위에 계속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경찰서 문을 열었다.
“하이킹하고 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 이 동네 사람인가?"
“아뇨, 부산에서 왔는데요.”
“여기는 총 같은 것도 있고 위험해서 안 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그리고 총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총 가져가면 어떻게 해? 안 돼. 다른 데 가봐!”
갑자기 기분이 이상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이란 얘기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란 생각이 들었다.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머리가 멍해졌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애원하듯 다시 부탁하였다.
“저 지금 너무 춥고 힘들어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재워주세요.
여기, 소파에서 잘게요.
무기고 있는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네?"
소용없었다.
허튼소리 말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는 말에,
너무 서럽게 느껴져 눈물이 나왔다.
혹시나 마음이 약해져 따라나오려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차갑게 닫힌 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온종일 땀을 흘리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는지.
‘그래, 설마 죽기야 하겠어? 밤새 한번 달려보자!’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다 죽어갈 것 같은 몸을 겨우겨우 추슬러 길을 가는데,
저만치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주유소였다.
다시금 희망이 뭉게뭉게 피어났다.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빠르게 페달을 밟아 주유소 앞에 도착했다.
“저, 하이킹하는 학생인데요.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될까요?"
"아! 밖이 상당히 추울 텐데.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여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맞아주는 환대에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겨우 참았다.
몸을 녹이며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재워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오히려 사장님이 오시면 큰일 나니 빨리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똑같구나.
어쩔 수 없지. 몸만 녹이고 가야겠다’
갑자기 침울해진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을까?
남아있는 눈물자국에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
그는 꼬깃꼬깃 구겨진 3만 원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요.
힘들게 여행하는데 잠은 잘 자야죠.
여관비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아뇨. 전 그냥 여기서 불만 좀 쬐다 가면 돼요. 괜찮아요.”
“받아요. 여관에 가서 따뜻하게 자요.”
그저 감사하단 말밖엔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는 내게, 빨리 가서 따뜻하게 자라는 얘기만 계속했다.
너무 고마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나를, 그는 문까지 열어주며 따뜻하게 배웅해주었다.
다시 자전거에 오르며 눈물은 마르고 몸은 찬바람에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다.
그날 밤, 깊은 산 속 어느 이름 모를 마을의 한 여관에서
나는 내 생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었다.
*
고3 때, 1시간 정도를 자전거로 통학하며 시작된 나의 자전거여행은
대학생활을 거쳐 군대시절까지 계속되었다.
남들과 다른 가정환경,
충족되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존재.
무기력한 나의 운명 앞에, 나는 지고 싶지 않아서일까?
무작정 달렸다.
그 속에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때의 기억들은 아주 오래된 낙엽처럼
나의 낡은 사진첩과 가슴 한편에 깊이 묻혀 있다.
지금 다시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아마 다시 태어나 그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난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옥천의 한 산등성이를 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그건 바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다.
언제나 깊은 절망과 어둠은,
희미한 희망의 빛과 함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희망이란 빛이 너무 희미해서 나중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오늘도 신은 내게 어둠을 보여주며 묻고 있다.
“여기서 그만 끝내고 싶은가?”
“아뇨, 그럴 순 없어요.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만 더….”
“그럼 조금만 더 가 보거라.
네가 날 버리지 않는 한, 나도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